주차장 청소하다 만난 개구리와 박쥐에 느낀 연민
입력2025.07.11. 오전 9:04
기사원문
경기도 신도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7층. 맨 꼭대기 층은 늘 고요하다. 젊은 고객들이 출근하기 전,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청소한다. 천장 틈에 깃든 새들은 그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바닥에는 배설물이 뿌려진다. 새벽 바람에 흩뿌려진 새들의 생존 흔적들. 그곳에서 때로는 세상의 외딴 구석을 마주하는 기분이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뜻밖에 한 생명을 발견했다. 쬐끄만 청개구리 한 마리가 시멘트 바닥, 광막한 주차장 공간 한가운데를 펄쩍펄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어쩌다 이곳에 왔을까? 이 높은 곳에.'▲ 결국 살려주지 못한 개구리 . ⓒ dawnoftime on Unsplash
아마 새가 먹잇감으로 물고 왔다가 놓친 모양이다. 살려주고 싶었다. 버려진 커피 컵을 찾아 화장실에서 물을 담아 놓아둘 수 없을까? 테이크아웃 컵, 플라스틱 용기, 종이컵 같은... 그러나 그날 따라 주차장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개구리를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텅 빈 주차장은 개구리에게 지옥같은 사막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7층에서 지하 2층 미화원들의 창고까지 내려가 개구리를 담을 용기를 가져오는 것은 시간 상 맞지 않는다.
결국 살려주지 못한 개구리, 미안한 마음 들었던 이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개구리를 찾았다. 혹시 기적처럼 살아있을까? 그러다 며칠 뒤 결국 그 넓은 주차장 바닥에서 말라붙은 작은 사체를 발견했다. 플라스틱 조각처럼 굳어버린 그것은 생명이라기보다 잔해에 가까웠다. 미안했다. 그 작은 몸 하나 살릴 수 없었던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마음이...
그날 이후 나는 그 공간에서 생명을 찾아 헤매는 버릇이 생겼다. 어떤 날에는 박쥐도 보았다. 한쪽 주차장 벽면에 젖은 종이장처럼 웅크러있던, 죽은 줄 알고 쓰레받기에 담으려고 빗자루를 댔더니
"끼익! 끼익!" 소리를 내며 몸을 꿈틀거렸다. 살아 있었다.
박쥐는 또 어떻게 들어왔을까? 박쥐는 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의 소리가 웅웅거리는 주차장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너머에 길게 개울이 있다. 아, 예전에는 이곳이 산과 들이 있는 자연이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이곳에 박쥐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환경이 바뀌자 박쥐는 인간이 만든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맨 꼭대기 7층 주차장에 움텄고, 아마도 천장에 붙어있는 배수관, 환풍기 통, 벽 틈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야행성이라 어쩌면 둥지에서 낙상했다고. 나는 제법 그럴듯한 추리를 해보았다.
작은 생명들도 뒤바뀐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쩌면 나 또한 노년이라는 또 다른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나 또한 그 작은 생명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노년의 일상을 살아간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생명들을 조우하며.
생명은 언제 어디서든 눈을 마주친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또 다시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다. 다들 주차장으로 몰려올 기세다. 작은 개구리 하나 끝내 살려주지 못한 내가 주차장을 청소하며 바란 것은 단 하나였다. 다음에는 어떤 작은 생명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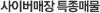







































0/2000자